
유방에 이상 증세가 느껴지거나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해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유방촬영 검사와 유방 초음파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이때 두 가지 검사를 꼭 다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유방촬영 검사와 유방초음파 검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잠실새내역유방외과 연세하와유외과와 함께 왜 두 가지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유방촬영 검사는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X선을 사용하는 검사로 유방을 눌러 밀착한 후 촬영하고 유방의 조직 내 결절이나 미세 병변을 파악하는 도움이 돼요. 유방촬영 검사는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 90~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유방촬영 검사는 유방을 의료기기에 최대한 압박해 유방 내 조성과 종괴, 비대칭 음영, 석회와 등의 병변들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고로 검사 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검사 시기는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리 후 2~5일 사이 유방이 가장 부드러운 시기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유방촬영 검사로는 유방 조직에 쌓이는 칼슘 성분인 미세석회화 병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미세석회화는 유방촬영 검사로는 관찰되지만 만져지지 않고 빨리 분열하는 세포에 점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요. 미세석회화는 유방암으로 발병할 수도 있지만 모두 유방암인 것은 아니에요. 이러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추적관찰을 하게 되고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인지 감별하게 돼요. 하지만 유방촬영 검사로는 우리나라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치밀유방을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힘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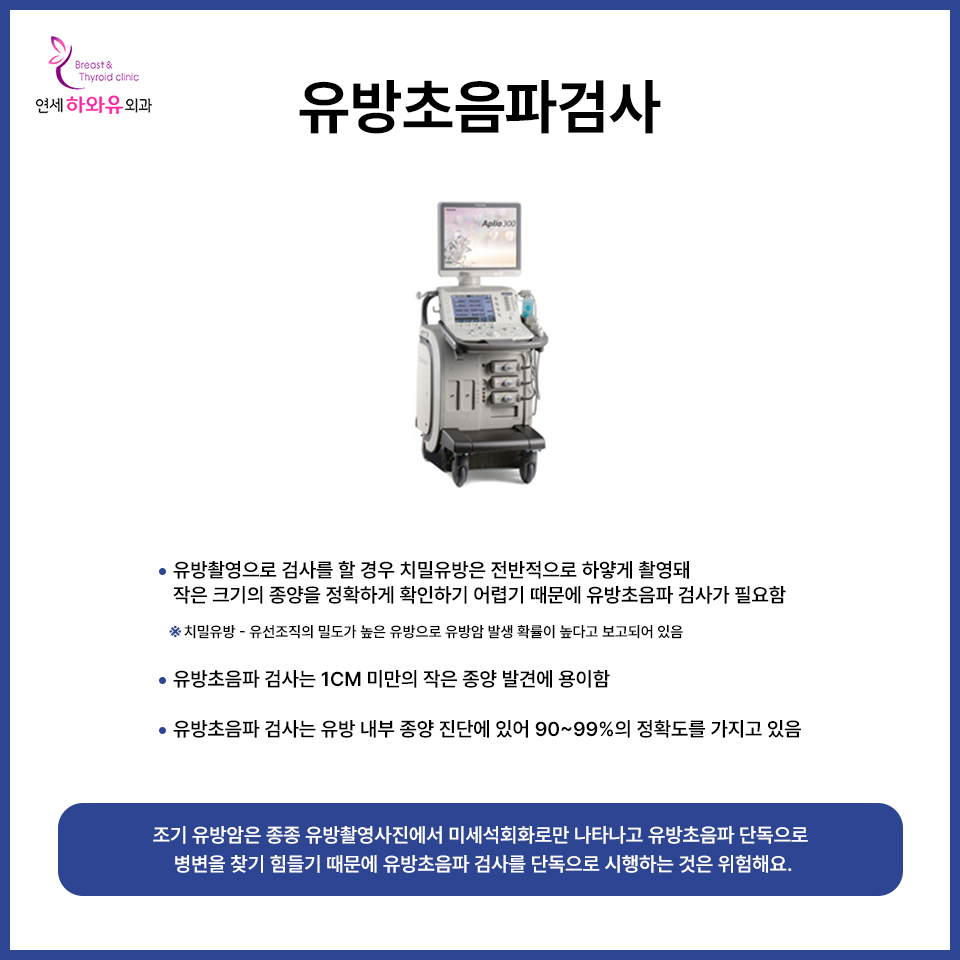
유선조직의 밀도가 높은 유방을 치밀유방이라 하는데 치밀유방은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유방촬영으로 검사를 할 경우 치밀유방은 전반적으로 하얗게 촬영돼 작은 크기의 종양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방초음파 검사가 필요해요.

유방초음파 검사는 1cm 미만의 작은 종양 발견에 용이하고 유방 내부 종양 진단에 있어 90~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조기 유방암은 종종 유방촬영사진에서 미세석회화로만 나타나고 유방초음파 단독으로는 병변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유방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험해요.

위처럼 유방촬영 검사만 시행하면 치밀유방으로 인해 병변을 찾기 힘들고 유방초음파 검사만 시행하면 미세석회화로만 나타날 수도 있는 병변이 있기 때문에 두 검사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두 검사를 통해 유방 내부의 종양의 특징과 위치, 크기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암으로 의심되는 조직검사를 진행해야 해요.

이처럼 유방촬영 검사와 유방 초음파검사를 같이 진행했을 때 단독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유방암은 여성 암 중 발병률 1위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그렇기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